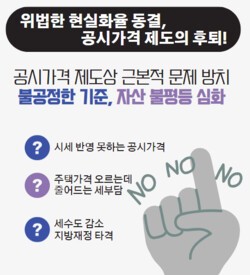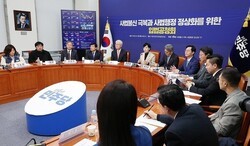거제도엔 그녀가 산다. 겨울도 그리 춥지 않은 자기네 동네로 한번 놀러 오시라는 그녀의 초대엔 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우린 일상에 매인 탓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속절없는 세월이 10년 넘게 지나갔다. 이러다간 그녀가 사는 섬에 함께 갈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겠다 싶어 겨울 정기모임을 거제도에서 하기로 했다. 부랴부랴 숙소를 예약하고 2박 3일 일정을 잡았다. 회원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터라 가까운 지역끼리 모여서 승용차로 떠났다.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출발한 차량 네 대가 진주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다. 겨울 같지 않게 화창하고 따사로운 날씨에 우린 한껏 고무되었다. 축복받은 기분이었다.
장승포항에는 아주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 1951년 10월에 개업한 집이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고객들의 사랑과 맛을 지켜낸 맛집을 만나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녀와 합류하자마자 중국집부터 찾아갔다.
찹쌀 탕수육과 팔보채, 하얀 짬뽕, 짜장면 등 음식 맛에 대한 궁금증과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골고루 시켰다. 쫀득하고 아삭한 탕수육은 소스가 과하지 않아서 좋았다. 참기름을 넣은 하얀 짬뽕은 담백하면서도 특이한 맛이다. 고춧가루를 뺐는데도 짬뽕다웠다. 갖가지 해물이 큼직하게 골고루 들어간 팔보채는 보기엔 소박한데 세련된 맛이었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 담긴 음식이라 그런지 가격은 예상보다 꽤 비쌌다. 그릇과 테이블 등 식당 분위기는 예스럽고 시골스러웠는데 음식은 도회지의 일류 식당 못지않았다.
지심도는 동백섬이다. 장승포항에서 배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 섬엔 동백나무가 가득했다. 뭍에서는 보기 드문 흰 동백꽃도 있다. 동백 잎사귀는 한겨울인데도 윤기가 반지르르하고 아주 실해 보인다. 붉은 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는데도 멀리서 보면 초록색만 보일 만큼 잎사귀가 무성하다. 나무가 이리 울창하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튼실한 뿌리 덕분이다. 얼핏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하다. 지금 보이는 꽃도 작년에 지나간 그 송이가 아니다. 새로 온 손님이다.
맹종죽 테마파크는 최근에 조성된 울창한 대나무 숲 놀이터다. 산을 휘감아 오를 수 있게 다듬어 놓은 산책로를 걷는데, 대숲에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두런거리는 사람들 소리 같다. 문득 내가 장편소설의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대나무 사이로 바다가 멀지 않게 보인다. 광활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다도해다. 크고 작은 섬이 점점이 박힌 청록색 바다는 아름다운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바둑판처럼 가지런히 놓인 양식장의 하얀 부표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깝다.
공곶이는 개인 소유의 땅에 조성한 수선화 동산이다. 제철이 아니라 아직 꽃은 없지만, 머잖아 이 동산에 노란색이 가득 찰 것이다. 좁은 산책로에 대나무가 빽빽하고,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쓸모없는 돌밭이었던 이 언덕을 수선화 명소로 만든 분은 강 씨 할아버지 내외분이다.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파른 비탈에 계단으로 된 산책로를 만드느라 잠시도 호미를 놓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수선화 뿌리를 캐고 심으며 동산을 다듬는 중인데, 두 분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다.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하는 요즘 세상에, 애써 가꾼 정원을 입장료 한 푼 없이 공개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름 앞에 아무런 직함도 내세우지 않아 더욱 존경스러운 강 씨 어르신께 감사 인사가 절로 나왔다.
공곶이 언덕배기에서 동백나무 터널이 있는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다를 만난다. 바닷가엔 항아리 누름돌로 쓰면 딱 좋을 큼직한 조약돌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동글납작한 돌멩이 사이로 파도가 스며든다. 길쭉한 느낌표 모양의 섬과 마침표 같은 동그란 섬을 지나온 물결이 잠시도 쉬지 않고 돌멩이를 다듬는다. 온 바다에 햇살이 가득하다. 바람 한 점 없이 따스한 겨울 볕이 온 얼굴을 감싼다. 예구 마을 옆에 숨은 오목한 해변에서 다들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다. 우리는 돌멩이 위에 철퍼덕 주저앉아 어린아이들처럼 즐겁게 놀았다.
거제 장은 반나절 장이라 오전에만 열린다. 주로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서 잡은 생선과 직접 농사지은 푸성귀를 갖고 닷새에 한 번씩 모인다. 이번 장엔 제철 맞아 알을 잔뜩 품은 대구가 대장이다. 가자미, 서대, 민어, 능성어, 우럭 등도 금방 잡아서 물이 좋을 때 해풍에 꾸덕꾸덕하게 말렸다. 장에 나온 반건조 생선 모두 심심하고 비리지도 않아 맨입에 먹어도 괜찮다. 구워도 맛있고 쪄 먹어도 일품이다. 오전 장이라 현지 주민도 장날을 맞추기 힘들다는데, 우린 아침 먹고 나오는 길에 장터를 지나게 되어 용케 만났다. 저녁에 숙소에서 함께 구워 먹을 것과 각자 집에 가져갈 반건조 생선을 종류대로 골고루 한 보따리씩 샀다.
그녀가 사는 섬의 진짜 별미(別味)는 따로 있었다. 한적한 동네 허름한 방앗간에다 호박고지만 갖다 주면 찹쌀과 팥고물은 알아서 넣고 시루떡을 해 주었다. 거제댁도 자기 텃밭에서 직접 길러 가을볕에 정성껏 말린 늙은 호박고지를 갖다 주고 시루떡을 맞췄다. 금방 쪄낸 따끈하고 말랑한 시루떡은 어린 시절의 맛이었다. 단맛이 풍부하고 쫀득한 떡을 베어 문 순간, 우리는 잊고 있던 유년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갔다. 따스하고 엽렵한 그녀에게서 돌아가신 친정엄마 냄새가 났다. 다들 고마운 마음에, 모임의 막내인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