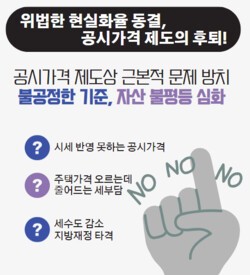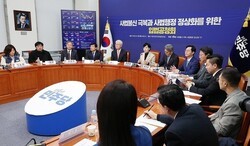오전 9시 11분에 출발하는 도버行 뉴저지 트랜짓(New Jersey Transit)은 이 층으로 된 쾌적한 기차였다. 나는 뉴욕 맨해튼 34번가에 있는 팬스테이션에서 열차를 타고 뉴저지 메디슨으로 향했다. 빌딩 숲속에 있는 역(驛)에서 출발하여 링컨 터널을 빠져나오자 풍경이 확 바뀌었다. 그림보다 더 멋진 갈대숲이 기습적으로 나타났다. 나지막하고 한적한 마을 풍경을 따라 기차가 여유롭게 달렸다.
나는 지금 뉴욕 여행 중에 우연히 연락이 닿은 K 목사네 집에 가는 길이다. 이번 여정의 끝자락에 이런 기차여행이 들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무르익은 늦가을 정취가 더없이 아름답다. 메디슨 역에 내리니 기다리고 있던 K 목사가 반갑게 맞는다. 그도 어느새 쉰 살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내 눈엔 여전히 재기발랄한 고등학생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를 유서 깊은 그린빌리지 감리교회로 안내했다. 1840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드류 신학교 학생이던 아펜젤러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며 목회했던 곳이다.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배재학당도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셨던 교회는 그리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미국 법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담하면서도 근엄한 분위기였다. 근 2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낸 교회에 내가 와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K 목사는 한국에서 군목(軍牧)까지 다 마치고 조금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왔다. 구약학(舊約學)을 공부하던 그가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사학(醫史學)을 전공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관에 세 들어 사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런던의 비싼 생활비를 피해 이곳으로 왔고, 지금 한창 박사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목사관은 소박하면서도 정갈하고 탄탄하게 지은 전형적인 미국식 주택이었다. 그의 아내와 초등학생 외동딸이 우리를 바비큐 테이블이 있는 뒷마당으로 안내했다. K 목사가 직접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사이, 정성이 가득 담긴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금방 구워진 따끈한 고기를 연신 내 접시에 놓아주는 K의 눈빛이 매우 정중하고 따뜻하다. 진심이 담긴 융숭한 대접에 가슴이 뭉클하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다.
그는 30여 년 전에 부평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가르친 학생이다. 그때 나는 교회 앞에 있는 목사님 사택 2층에 세 들어 살았다. 주일이면 우리 집을 고등부 분반 공부 장소로 사용했다. 행사 준비하느라 교회에 모였다가 출출하면 언제든 라면 끓여 먹기에도 딱 좋았다. 우리 집은 고등부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나는 대학 4년 내내 대학연극부에서 연극에 미쳐 살았다. 연기는 물론 대본 쓰는 일부터 무대감독, 연출, 기획까지 가리지 않고 다 섭렵했다. 졸업하면 당연히 연극계로 나가리라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붙들 용기가 없어서 안정된 길을 택했다. 나는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 되었다. 부임하자마자 학교에 연극부를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연극을 만드는 일에 또 미친 듯이 몰두했다. 하지만 열정으로 빛나던 나의 시간은 3년에 불과했다. 결혼과 교직을 맞바꾸었고, 연극과도 멀리멀리 헤어지고 말았다.
그런 내가 부평 교회에서 열정과 재능을 갖춘 제자들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밤낮없이 몰두해도 힘들지 않았다. 구약 성경 ‘호세아’를 통째로 각색하여 연극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완성도가 꽤 높았다. 우리가 만든 연극은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등부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K는 유난히 영특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연극을 만들 때마다 조연출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면서 음악성도 탁월했다. 또래들보다 생각도 깊고 매우 철학적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난해한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나는 언제나 그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적절한 대답을 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K는 열일곱 살, 나는 서른 두어 살이었다. 모든 면에서 어리고 미숙했던 내가 어떻게 K의 심오한(?) 질문을 알아듣고 대답해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봐도 내 힘만은 아니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많고 조숙했어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해 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셨어요. 저는 그때 선생님이 해 주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럴 때 선생님은 뭐라 하실까 생각하곤 했지요.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제 속에 있는 말을 술술 다 할 수 있게 만드시거든요. 오늘도 선생님과 대화하는 중에 오래 고민했던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되었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메디슨역(驛) 플랫폼에 서서 뉴욕행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K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말이 자꾸만 감겨든다. 이미 나보다 학문이 깊어진 제자에게 어찌 선생 노릇을 해 줄 수 있을까.
30년 후에도 선생이 되어 달라는 제자의 말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먼 하늘을 보았다.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는지도 모르는 채 이끄시는 대로 가는 승객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잠시 같은 시간 속에 머물며, 같은 풍경을 공유했던 그 짧은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뿐이다.
기약 없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이, 낯선 역(驛) 플랫폼에 오렌지빛 고운 노을이 그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