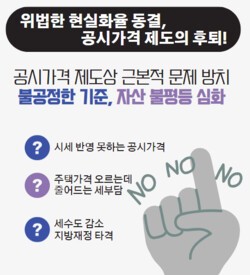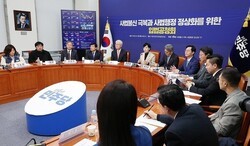언덕배기에는 좁은 골목길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잠시라도 한눈팔다 보면 길모퉁이에서 헤매기 십상이다. 시간에 쫓길 때는 왔던 길을 맴돌다가 집 찾는데 애가 타기도 한다. 묵직한 반찬통을 들고 이리저리 뛰다 보면 다리는 후들거리고 등에 땀방울이 맺힌다.
쪽방촌은 도시의 빌딩 숲 뒤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곳.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외로운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공간이다. 불빛 찬란한 도시와의 경계 너머 웅크린 채 살아가는 소외된 자들의 은둔처이다. 한 가닥 남은 희망을 놓쳐버릴까 근심할 여력도 없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외로움을 달래 줄 따뜻한 손길이 아쉽기만 하다.
매주 월요일 이른 아침이면 좁은 식당이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인다. 주방에는 여성들이 냄비나 프라이팬에다 끓이고 데치고 무쳐 갖가지 반찬을 만든다. 남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통에 음식을 하나둘씩 담아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넣고 포장한다.
이제 승합차에 옮겨 싣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쪽방촌으로 향한다. 우리 일행은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허술한 옥탑방 앞에 섰다. 녹슨 철 대문은 열릴 줄 모른다. 바깥에서 부르고 문을 두드려 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처음에는 안에서 “누구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었는데, 문 열어달라는 말에 인기척마저 뚝 끊겼다. 한참 동안 기다리다 다시 시도해 보지만 버티고 서 있는 대문만 야속할 뿐이다.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누구를 맞이하는 방법마저 잊은 건가.
“여기 문간에 반찬통 두고 갑니다.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못내 아쉬워 혼잣말이라도 한 마디 남기고 다른 집을 찾아 길을 나선다. 다음은 언덕 너머 골목길 끄트머리 집이다. 다행히 대문이 열려 있다.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할머니가 일어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다행이다. 이번에도 못 만나면 어쩌나 싶었다. 마침 도우미 아줌마가 밥도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 주러 와있다. 들어오라며 현관에 신발 놓을 자리를 마련해 준다.
할머니 손을 잡으며 잘 지내시느냐고 안부를 물어본다.
“그냥 겨우겨우 지내지요.”
어쩐지 경계하는 눈빛이다. 가져온 반찬 봉지를 내밀며 우리들의 정성이니 잘 드시고 힘내라고 덕담을 건넨다. 할머니는 별말 없이 봉지를 도우미에게 밀쳐 넘겨준다. 자녀분은 어떻게 되냐고 여쭈어보니 대뜸 자식 자랑에 신명이 난다. 아들 하나 두었는데 지방 도시에 취직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산다고 한다. 혼자 사시니 적적하지 않냐고 하니 그냥 묵묵하다.
이제 식사할 시간이라고 도우미가 눈치를 준다. 잠시 짬을 내어 할머니에게 은근히 내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남은 삶을 신앙 생활하며 지내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도 해 본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딴청을 부린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도 한다. 자식 일을 물어볼 때는 그리 잘 알아채고 말씀도 잘하셨는데….
어디에 정 쏟을 데가 없으니 사는 재미가 사라진 지 오랜 모양이다. 기다린다는 게 뭔지, 그리움이 있기라도 한 건지. 오직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나면 그만이다. 간혹 독지가가 있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내심 무감각하다.
집에만 있으니 보고 듣는 건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뿐이다. 살기는 팍팍하고 정치는 갈피도 못 잡는데, 즐겨 보는 연속극마저 막장 드라마가 버젓이 판을 친다.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사는 사회,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자는 공동체 정신은 배부른 자들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연탄 배달하며 얼굴에 검은 칠 몇 번 하고서 웃으며 사진 몇 장 찍고 떠나는 이들에게 쪽방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라도 있겠는가.
아직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삶에 대한 긍정의 힘이 작동할 때 행복을 찾으려는 의지도,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도 갖게 될 터이니. 소시민들의 아름답고 진실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마음만은 따뜻해지리라.
“세상에 어디 하나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집 앞에 서서 무심히 한 소리 한다.
“너희들이 내 맘을 알아?”
더는 참기 어렵다는 듯, 닫힌 철문에서 나오는 쓸쓸한 한마디가 귓전에 웅얼댄다.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