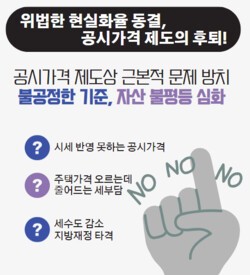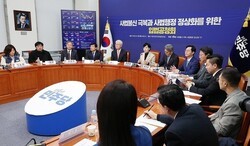나는 공이다. 가죽 껍질의 조그만 내 몸속에는 바람이 가득 차 있다. 가볍고 탄력이 있어 땅바닥에 구르기도 하고 통통 튀기도 곧잘 한다. 남들은 공처럼 둥글게 살라 하지만, 그 말이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보기도 좋고 갖고 놀기는 쉬워도 둥글고 가벼운 생김새가 내 고통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줄이 하얗게 쳐진 네모난 공간 안에서 산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역할이 있고 가치가 인정된다. 바깥으로 나가면 누군가의 손에 들려 던져지거나 발로 차여서라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직, 아득히 보이는 흰색 사각형 안에 쳐진 그물망으로 내가 곤두박질치며 걸리길 기다린다.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부터 운동장을 정신없이 구르고 달린다. 한두 명도 아니고 스무 명이 넘는 선수들이 나를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먼저 잡아채는 사람이 임자다. 달리고 차고 던지고 박고 짓누르며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기편 선수에게 나를 넘겨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어깨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먼저 받으려고 새처럼 온몸을 날리기도 한다. 나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칠까 싶어 조마조마하다.
어차피 운동장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있어야 경기가 시작되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선수들 모두가 나만 바라보며 운동장을 뛰고 또 뛴다. 나는 그들이 하는 대로 발로 차이고 맞고 구르고 또 구른다.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때도 있다. 아껴주며 귀하게 여겨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이리 내게 몹쓸 짓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리저리 헤매며 정신없이 쏘다니다 보면 어느덧 쉬는 시간이 된다. 나도 한시름 놓는다. 선수들과 더불어 숨을 고르고 땀을 식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야속한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선수들을 호출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따라나선다.
이제 후반전의 시작이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이전보다 힘이 들고 지쳐도 이 네모난 경기장을 지켜야 한다. 힘들다고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
목이 마르다. 햇볕이 내리쪼이고 땀이 범벅이 되어도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이 없다. 넘어지고 다치면 선수들은 보살펴 주지만 나는 늘 외톨이다. 그나마 내게 위로가 되는 건 응원단이다. 모든 시선이 나의 움직임을 따라다닌다. 잠시도 한눈파는 사람이 없다. 다른 팀에 나를 빼앗기면 실망하고 한탄하다가 자기편 공격수가 나를 차며 적진으로 달릴 때면 모두 일어나 손뼉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
내가 정말로 멋져 보일 때가 있다. 선수가 나를 데리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쏜살같이 달리는 순간이다. 관중들은 소리를 지르고 나도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신명이 절로 난다. 야간에 불빛 조명이라도 받으면 몸에 빛이 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선수들과 한마음이 되어 정신없이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골문 앞에 다다른다. 선수의 마지막 발끝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그물에 걸리면 관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른다.
나도 덩달아 희열을 느낀다. 세상이 모두 내 것이 된다. ‘아,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생각에 피로와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진다.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정말 멋지다. 그런 나를 바라보며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한다. 관중석에는 가족들과 얼싸안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옆 사람을 붙잡고 우는 사람도 있다.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끼리 어깨동무하며 서로를 격려해 준다. 오늘 얼마나 잘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 경기를 위해 나도 긴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땐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있을까. 감독이 선수를 고르고 새로운 작전을 짜면 내가 할 역할도 많이 달라지겠지.
관중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관중석에는 함성과 탄식의 조각들이 패잔병처럼 널브러져 있다. 선수들의 땀으로 얼룩진 운동장 한구석에 나와 내 친구들 몇몇이 동그마니 놓여있다. 경기장에 우리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수는 오직 자신의 평판이나 팀의 승리를, 관중들도 자기편이 이기기만을 바란다. 끝까지 희생양이 된 나의 수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도 나는 축구팬들과 기쁨과 슬픔을, 위로와 원망을, 희열과 좌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또 다른 하루를 맞는다. 내 몸이 둥글고 여유롭기에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