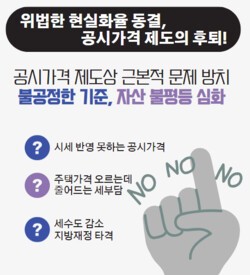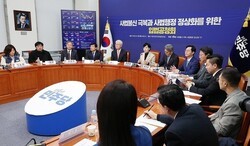경찰서 교통과에서 딱지가 날아왔다. 우체통을 여는데 낯선 우편물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봉투를 뜯어보니 집 근처 도로변에서 자동차 속도위반을 했단다. 자그마치 12km나.
그날 일을 돌이켜 보았다. 가족들과 외식 나갔다가 무심코 액셀을 밟던 중에 경고음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언뜻 계기판의 표시가 제한 속도를 조금 넘기는 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우리 동네는 길만 나서면 온통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30km 속도 제한 표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아예 동네의 거리 전체가 노랑 물결 일색이다. 길바닥에도 노란색 주의 표지 선이고 신호등도 지주를 포함해 전체가 노란색이다. 천천히 가는 운전연습장 같다.
제한 속도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등하교 시간이든 수업 중이든 상관이 없다. 똑같이 30km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큰길로 접어들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 위로 발이 올라간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니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많은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학교가 파할 무렵이면 길거리에 움직이는 노란 표시등이 재잘거리며 한 무리씩 지나간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서도 앞에 차가 없다고 속도를 냈다가는 내비게이션에서 여지없이 경고 신호가 울린다. 속도에는 에누리가 없다. 몇 km 정도는 봐줄 수도 있으련만.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길 위에 멀뚱히 서 있는 키다리 신호등 아저씨도 모른척하지만 다 알고 있다. 속도 표지판을 그냥 지나칠 때는 아차 싶어서 세상 눈치는 혼자 다 본다.
지방에 일이 있어 고속도로를 달렸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속도 제한 표시이다. 얼마 전 새 차를 장만했던 터라 운전하기 편해졌다. 운전대도 좌우로 돌리기 쉽고 액셀은 조금만 밟아도 가속도가 붙는다. 그 덕에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늘어났다.
운전이 편해지니 없던 여유도 생겼다. 뒤에서 오는 차가 끼어들어도 느긋하다. 옆에 있는 차가 나보다 빨리 달리면 추월당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알아서 양보하는 순한 양이 따로 없다.
차선 바꾸는 일도 예전보다 조심스럽다. 앞뒤로 차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를 기다려 좌우를 여러 번 살핀 후 자신 있을 때만 들어간다. 순간 반응 속도가 더뎌진 탓이다. 앞이나 옆 차선에 짐을 잔뜩 실은 화물차를 발견하면 다른 차선으로 옮기거나 속도를 늦추곤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감보다 안전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다.
운전대를 잡은 지 사십 년이 훌쩍 지났다. 내가 달린 길도 국내와 해외 모두 합쳐 수십만km는 됨직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른길도 있었고 오르막 내리막이 이어지거나 급커브 길도 종종 만났다.
오솔길이나 외길에서 마주 오던 차와 마주치기도 했고, 길을 잘못 들어 견인차를 부를 때도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기름이 떨어져 보험회사 신세도 져 보았다. 파란만장한 운전 이력은 행운과 불행이 번갈아 닥치는 내 삶의 한 단면과 같다.
요즘은 허리가 아프고 어깨와 발목도 시큰거린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 동네에 헬스장이 생긴 이후로는 거기서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운동에 열을 내 본다. 눈도 침침해지고 한곳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세상을 세밀히 다 보려 하지 말고 모른척하며 살라는 하늘의 뜻이다.
천천히 움직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심도 여유 있게 하고 행동은 느긋하게 하라는 무언의 표시다. 조금만 급하게 움직이면 몸이나 마음에 경고등이 켜진다. 자동차 운전은 예전보다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럭저럭 모범은 아니더라도 착한 운전자가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 언제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려나, 그것이 궁금하다. 마음은 청춘이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몸 상태가 우선이다.
운전대를 놓는다는 건 자기 보호 본능의 작은 실천이다. 신호등 눈치 볼 일도 없고 속도 표시판은 모른척하고 지내도 된다. 나이 든다고 서글퍼하기보다 세상살이가 편해지니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저 멀리 녹색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중이다. 나의 오른쪽 발은 이미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