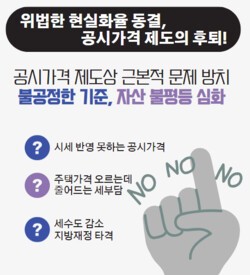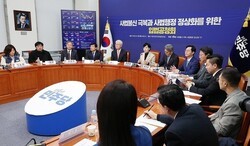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걷기 좋은 길이라 했지만, 팔월의 무더위 속에 다산초당을 오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의 유배지가 어찌 편안하고, 다산을 만나러 가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수월하겠는가.
소나무 뿌리가 삐죽이 나온 산길을 올라야 하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한다. 대나무 담장을 잡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는 옷매무새를 고쳐 잡으며 숨을 고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는 산 중턱에 길도 없는 길 위에 있다. 다산은 이 길을 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산의 자취에 다가선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선생의 지혜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깊어진다.
어느 시인은 이 길을 ‘뿌리의 길’이라 불렀다. 뿌리는 백성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공직자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숲을 지탱하듯 사람 또한 어울려 살아야 한다.
예전에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옮겨 심은 메타세쿼이아가 뿌리를 잇지 못해 시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대변한다. 다산 역시 백성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뿌리의 의미를 이 길에 새겼으리라.
선생은 외가인 해남윤씨 가문으로부터 산정(山亭)을 희사받아 손수 터를 닦고 밭을 일구며 집을 단장하였다. 스무 해 가까운 유배 생활이 끝나고 귀향한 뒤 다산은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가족과의 생이별과 국가 개혁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좌절을 달래며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방대한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초당은 비록 후대에 다시 세워졌으나, 다산 4경에는 선생의 숨결이 서려 있다. 초당 뒤 언덕 바위에 새겨진 ‘丁石’ 두 글자는 돌처럼 변치 않겠다는 다짐이요, 자신을 가다듬는 좌표였다. “기러기 발톱의 흔적처럼 또렷하다”라고 말했듯이 선생은 이 두 글자를 좋아하여 손수 쓴 묘지명에 넣을 정도로 의미를 크게 두셨다. 꼿꼿하고 정갈한 선생의 기품이 엿보인다.
‘약천(藥泉)’은 다산이 손수 땅을 파서 만든 옹달샘인데, 여기서 솟아나는 물로 차를 끓여 마셨다고 한다. 옥정(玉井)이라 부를 만큼 선생은 이 샘을 사랑하여, “한 바가지 떠 마시면 찬하(餐霞)인 듯 상쾌하다”라며 시를 지어 읊었다. 바위에 낀 이끼는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준다. 바위 틈새로 나온 예닐곱 개의 고사리 잎새가 청명하기 이를 데 없다.
초당 앞뜰에는 널찍한 돌이 하나 놓여 있는데, 선생은 그것을 ‘다조(茶竈)’라 이름 지었다. 약천에서 나온 물을 이 돌 위에 올리고 솔방울을 피워 차를 끓였다. 다조를 마주하며 차를 다리는 시간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며 선(禪)의 경지에 들어갔으리라.
다산은 초당 옆 마당에 축대를 쌓고 연못을 파서 연지를 만들었다. 그 한가운데는 강진 해변에서 가져온 돌을 올려 동산을 이루고 그 이름을 ‘연지석가산(蓮池石假山)’이라 하였다.
선생은 진짜 산보다 만든 산이 더 멋지다고 스스로 감탄하며, “물밑 고요히 바라보니 푸른 산빛이 어렸구나”라며 즐거워하였다. 그러고 보니 여름 산의 그림자가 시원한 물속에 아른거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제 나는 선경을 둘러보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창밖에는 매미 소리가 한창이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이 여름날, 글을 읽고 쓰는 내 집이 바로 초당이다.
지난해 친구가 지어준 호를 따서 자연을 벗 삼아 삶을 경영하는 곳, ‘하영초당(霞營草堂)’이라 부르련다. 비록 작은 연못 하나 지을 땅도 없고 이름 새길 만한 바위 하나 없지만,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글 쓰는 잉크는 마를 날이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다산의 제자다움을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
다산기념관 앞뜰 돌 판에 새겨진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일깨운다.
“근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든 줄 모르고, 높이 오르려는 자는 피곤한 줄 모른다.”
그 길고 험한 뿌리의 길을 회상하며, 나는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