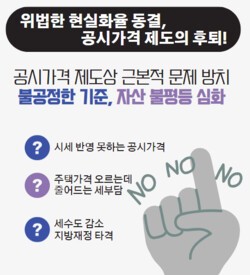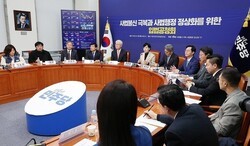무더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문득 그 겨울의 기억이 떠오른다. 몇 해 전, 내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울림을 남긴 인형극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한다.
2021년 겨울,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일상은 멈춰선 듯 정지되어 있었다. 모두가 지치고 외로웠던 그 시절,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한 어린이병원에서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 소속의 중증 환아들이 퇴원하여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1대1 인형극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아이의 집을 직접 방문해 단 한 명을 위한 공연을 해달라는, 말 그대로 ‘맞춤형 위로’였다.
나는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작은 공연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나는 손인형극 세트를 철저히 소독하고, 마스크와 방호를 완비한 채 각 가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집에선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운 한 아이가 있었다.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없어 하루 왼 종일 누운 채 생활해야 했고, 엄마와 가정교사가 양옆에서 아이를 조심스레 부축한 채 나의 인형극을 함께 관람했다. 아이는 두 눈을 꼭 감고, 말 한마디 없이 인형극 무대 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가며, 손끝에 있는 인형에 온 마음을 담았다. 혹여 그 아이의 마음에라도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작은 손인형 하나에 나의 온 에너지와 진심을 실어 공연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에게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눈을 뜨지도 않고, 몸짓도 없었다. 공연을 마친 나는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라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엄마와 가정교사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들은 아이가 인형극의 소리를 듣고는 기뻐서 몸의 근육을 움찔하며 움직였다고 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소리를 따라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무대 위 박수갈채가 아닌, 아이의 작은 떨림이 내게 돌아온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었다.
‘아,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안겨준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공연을 잘했는가’라는 의문보다 ‘누군가에게 다가갔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열네 가정을 방문했다.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고, 아이마다 사연이 달랐다. 어떤 아이는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 곁에는 늘 가족이 있었고, 나의 작은 인형극 하나에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손을 잡아주었다.
매 공연마다 나는 비로소 손인형극의 진짜 힘을 깨달았다.
무대도 조명도 없는 작은 방 한쪽에서, 인형 하나와 사람 하나가 마주한 순간이 어쩌면 가장 진실한 ‘극’이 아닐까. 그 안에는 연출도, 대사도 필요 없었다. 오직 마음과 마음만이 존재했다.
인형극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을 멈추고, 그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주는 ‘예술의 언어’이다. 나는 이 공연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배웠고, 예술가로서의 자긍심도 되찾을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나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와줘서 고마워, 내 인형을 봐줘서 고마워, 웃어줘서 고마워.“
그 작은 교감 하나하나가 내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희망의 조각이 되었다.
때론 큰 무대보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공연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릴 수 있다. 내가 느낀 감동을 표현하자면 이 말로 충분하다.
“내가 즐거워야 인형도 살아 숨 쉬고, 그 숨결이 관객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
2021년의 성탄절, 나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산타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내게, 다시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눈 내리던 성탄절, 그 의미 깊던 인형극을 떠올리며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어본다.